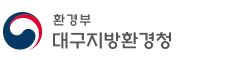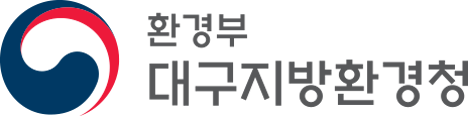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알림마당
전체
- [한겨레,0419] 야생동물과 함께 살려면
-
- 등록자명 :
- 조회수 : 1,376
- 등록일자 : 2004.04.19
-
여우가 26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던 민통선 지역인 강원도 양구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이 오늘부터 2차 현지조사를 시작한다. 이번에 살아있는 여우를 확인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민들의 목격담과 배설물 등을 통해 여우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다. 여우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왜 그럴까. 모피를 얻을 수 있다거나 농사에 해로운 쥐를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우가 우리 자연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옛날 이야기나 기억에 남아있는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그럴듯하다. 다시 말해 야생동물은 무슨 이용가치가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여우가 없는 숲은 왠지 허전하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보전과 복원은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거제도 구천댐의 수달 두세 마리를 이웃 연초댐으로 옮기는 ‘이사비용’만도 5천만원이다. 사실 올해 진행될 이 사업의 성패는 앞으로 수달이 멸종을 피할 것인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5년 동안 조사한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조사한 전남·북 하천의 절반 가까이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의 70% 이상에서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고립·분산돼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급속도로 멸종이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도로와 댐 건설로 삶터가 사라지고 수질 오염과 물고기 남획은 수달의 먹이를 앗아간다. 이 연구원 원창만 연구사는 “요즘 부쩍 수달이 자주 목격되는 이유도 숫자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서식지 교란으로 이동하다가 눈에 띄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야생동물 보전은 사실 낭만보다는 갈등을 낳는다. 철새나 멧돼지와 농민 사이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해결책으로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을 도입했다.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철새를 위해 지출하는 세금은 지난해 18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늘었다. 철새 도래지에 가까운 충남 서산 등지에서는 올해부터 논에서 농사를 지은 뒤 수확하지 않고 고스란히 새 먹이로 제공하면 ㏊당 약 1천만원을 농민에게 준다. 농업소득을 전액 보상하는 셈이다. 보리밭은 300~400만원을 보상한다. 두루미가 찾아오는 강원도 철원에서는 추수 뒤 논을 갈아엎지 않아 철새가 낙곡을 먹도록 하면 이듬해 경운비용을 ㏊당 30만원씩 준다. 이런 보상액의 70%는 지방비이지만 지자체는 이 제도에 의욕을 보인다. 농민의 오랜 불만을 달래고 철새 도래지를 생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복한 타협은 아직 드문 편에 속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야생동물의 존재는 아예 묵살당하기 일쑤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제적으로 순전히 ‘동아시아 최대의 철새도래지 상실’이란 문제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오래 논란을 벌이면서도 새가 입에 오른 일이 거의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마침내 새만금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요·물떼새 휴식지인 옥구염전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파헤쳐지는 일이 벌어졌다. 천일제염이라는 인간과 새가 오랫동안 공존해 오던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방식은 투기적인 새우 양식장에 자리를 내주었다.
인간중심주의는 아직 강고하다. 최근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공사를 반대하며 천성산의 도롱뇽과 내원사, 환경단체가 낸 이른바 ‘도롱뇽 소송’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관통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도룡뇽과 그 법적 후견인을 자처한 환경단체한테는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목소리는 아직 여우나 수달 같은 ‘스타’ 야생동물에게만 허용될 뿐 도요새와 도롱뇽에게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백인과 남성과 부자에게만 허용되던 법적 지위가 법인, 회사, 도시, 국가 등 비인격체로까지 확장된 것처럼 자연물도 언젠가 그 자격을 얻을 것이다. 자연을 이용할 수단이 아닌 더불어 살 동반자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과 윤리가 아닐까.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